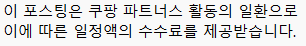
고향 [그의 얼굴]
현진건
1926

원문 PDF 파일 다운로드 받기
줄거리 및 작품소개
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D%96%A5_(%EC%86%8C%EC%84%A4)
고향 [그의 얼굴]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
를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막 격으로 ‘기모노’를 둘
렀고 그 안에선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
었다.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
로 지은 것이었다. 그러고 발은 감발을 하였는데 짚신을 신었고 ‘고부가
리’로 깎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
미는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찻간에는 공교롭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
이었으니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의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말로 곧잘 철
철 대이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도코마데 오이데 데수카”
하고 첫마디를 걸더니만 동경이 어떠니 대판이 어떠니, 조선 사람은 고추를
끔찍이 많이 먹는다는 둥, 일본 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처음에는 속이 뉘엿
거린다는 둥, 횡설수설 지껄이다가 일본 사람이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짜
르게 끊은 꼿꼿한 윗수염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까땍까땍하는 고개와 함께
‘소데수까’란 한 마디로 코대답을 할 따름이요, 잘 받아 주지 않으매, 그
는 또 중국인을 붙들고 실랭이를 한다.
“네쌍나을취?”
“니씽섬마?”
하고 덤벼보았으나 중국인 또한 그 기름 끼인 뚜우한 얼골에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띠울 뿐이요 별로 대꾸를 하지 않았건만 그래도 무에라고 연해 웅얼
거리면서 나를 보고 웃어 보였다.
그것은 마침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훌륭한 제
재조를 갈채해 달라는 웃음이었다.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 버렸
다. 그 주적대는 꼴이 어쭙잖고 밉살스러웠음이다. 그는 잠깐 입을 닥치고
무료한 듯이 머리를 더억더억 긁기도 하며 손톱을 이로 물어뜯기도 하고 멀
거니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암만해도 지절대지 않고는 못 참겠던지 문
득 나에게로 향하며,
“어데까정 가는기오?”
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붙인다.
“서울까지 가오”
“그런기오? 참 반갑구마, 나도 서울꺼정 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행이 되겠
구마.”
나는 이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에 대하여 무에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굳이 대답하기도 싫기에 덤덤히 입을 닫쳐 버렸다.
“서울에 오래 살았는기오?”
그는 또 물었다.
“육칠 년이나 됩니다.”
조금 성가시다 싶었으되 대꾸 않을 수도 없었다.
“에이구 오래 살았구마, 나는 처음 길인데 우리 같은 막벌이꾼이 차를 나
려서 어데로 찾아가야 되겠는기오? 일본으로 말하면 ‘기진야드’같은 것이
있는기오?”
하고 그는 답답한 제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려 보였다. 그때 나는 그의 얼
골이 웃기보담 찡그리기에 가장 적당한 얼골임을 발견하였다. 군데군데 찢
어진 겅성드뭇한 눈썹이 알알이 일어서며 아래로 축 처지는 서슬에 양미간
에는 여러 가닥 주름이 잡히고 광대뼈 위로 뺨 살이 실룩실룩 보이자 두 볼
은 쪽 빨아든다. 입은 소태나 먹은 것처럼 왼편으로 삐뚤어지게 찟어 올라
가고, 조이던 눈엔 눈물이 괴인 듯 삼십 세밖에 안 되어 보이는 그 얼골이
십 년 가량은 늙어진 듯하였다. 나는 그 신산(辛酸)스러운 표정이 얼마쯤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대한 반감이 풀려지는 듯하였다.
“글쎄요, 아마 노동 숙박소란 것이 있지요.”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기오?”
라고 그는 매어 달리는 듯이 또 채쳤다.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는지요.”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그러나 일자
리에 대하여 아모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데서 오시는 길입니까?”
“흥,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는 풀려 나왔
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따른 동리였다. 한 백호 남
짓한 그 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
집 땅을 부치는 것보담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
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
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
사에 소작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마는 소위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살겠다’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
의 입길에서 오르나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
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갔다.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 일곱 살 되던 해 봄에 (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가는 이의 운명이어든 어데를
간들 신신하랴. 그 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하
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츰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일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밑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 아홉 살밖에 안 된 그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사 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모친꺼정 돌아갔구마.”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자셨구마.”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함은 눈물
이 쏟아졌음이리라.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
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에 친구들이 사 준 정종병 마개를 빼었다. 찻잔
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시었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겨푸 다섯 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
다가 일본으로 또 벌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판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 보았다. 벌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
연히 방탕해졌다. 돈은 모을래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울화만 치받치기 때
문에 한 곳에 주접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립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 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구
경도 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디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뭔기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면 퍽 변했겠지요.”
“변하고 무어고 간에 아모 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않더마.”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단 말씀이오?”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가 담만 즐비하게 남았더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기오?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 했는기오?”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썩어 넘어진 서까래, 뚤뚤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오? 백 여호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오?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 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골을 똑똑히 본 듯싶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마,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마.”
하고 그의 얼골은 더욱 침울해진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 말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
도 좀 있던 사람인데…….”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 말이 있던 여자구마.”
“하―.”
나는 놀랜 듯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나.”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보담 나이 두 살 위였는
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
가 열 네댓 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
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 그런데 그 처녀가 열 일곱 살 된 겨울에
별안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이십 원을 받
고 대구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
리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물론 피차에 한 번 만나보지
도 못하였다. 이번에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
서 그 안해 될 뻔한 댁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궐녀는 이십 원 몸값을 십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육십 원이나 남았었는데 몸에 몹쓸 병이 들고 나이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 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 궐녀도 자기와 같이 십 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
오니까 거기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
이었다. 하로해를 울어 보내고 읍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십 년 동안에
한 마디 두 마디 배워두었던 일본말 덕택으로 그 일본 집에 있게 된 것이었
다.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도 변하는기오? 그 숱 많던 머리가 훌
렁 다 벗어졌더마. 눈은 폭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골빛도 마치 유산
을 끼얹은 듯하더마.”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더마.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한 열 병
따려 누이고 헤어졌구마.”
하고 가슴을 짜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낸 슬픔을 새록새록
이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치었음이더라.
“이야기를 다 하면 무얼하는기오?”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내 또한 너무도 참옥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
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되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흥
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리었다.
볏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작로가 되고요―
말마디나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12월 3일 밤)
(‘조선일보’, 1926. 1. 3.)
(『조선의 얼골』,글벗집, 1926.)
오늘의 성지 - 휴대폰 성지 가격 비교
비싼 요금제 없이 쿠팡보다 저렴한 모요특가
휴대폰 구매 지원금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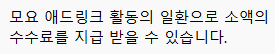









최근댓글